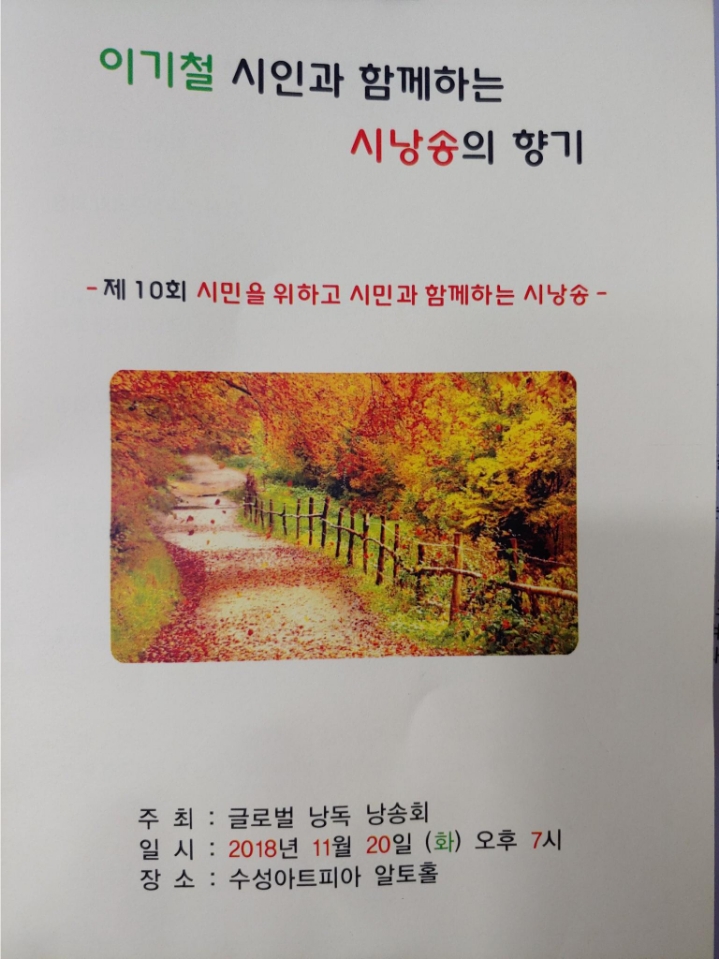여는 시
- 이기철 /근심을 지펴 밥을 짓는다 박영선 회장
꽃씨 떨어지는 세상으로 내려가
꽃씨보다 더 작게 살고 싶었다
나뭇잎이 지면서 남긴 이야기를 모아 동화를 쓰고
병에서 깨어나는 사람의 엷은 미소를 보며 시를 쓰고 싶었다
저 혼자 나들이 간 마음의 날개가 찢겨 돌아올 때마다
가제 손수건으로 피 묻은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어린 근심아, 강을 못 건너고 돌아오는 네 얼굴의 슬픔
더 멀리 거려던 네 꿈이 새의 죽지처럼 꺾였구나
들판이 강물을 보듬고 남은 햇살이 하루를 껴안을 때
너의 몸이 종이쪽처럼 가벼워졌구나
악의를 씻어 국 끓이고 가시로 돋는 증오를 빗질하면
어느덧 마음 한 켠에 파랑게 돋는 새 잎
모래의 마음이 금이 되는 날을 기다려
내 손수 지은 색동옷 갈아입히면
칭얼대던 근심들이 하얀 쌀밥이 되어 밥상에 오른다
그때 나는 너에게 상처를 보석이라고 ,
슬픔은 실밥 따뜻한 내복이라고
이 세상 가장 조그만 편지를 쓰리라
근심이 눈발처럼 흩날려도
날개 찢긴 근심이 돌아와 갈아입을 옷 한 벌 다림질하리라
슬픔이 아닌, 눈물이 아닌,
환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모닥불처럼 나누리라
● 작은 것을 위하여
이기철 정연미 낭송
굴뚝새들은 조그맣게 산다
강아지풀 속이나 탱자나무 숲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즐겁고
물여뀌 잎새 위에서도 그들은 깃을 묻고 잠들 줄 안다
작은 빗방울을 일부러 피하지 않고 숯더미 같은 것도 부리로 쪼으며
발톱으로 어루만진다 인가에서 울려오는 차임벨소리에 놀란 눈을 뜨고
질주하는 자동차소리에 가슴은 떨리지만 밤과 느릅나무 잎새와 어둠 속의
별빛을 바라보며 그들은 조용한 화해와 순응의 하룻밤을 새우고 짧은 꿈속에
저들의 생애의 몇 토막 이야기를 묻는다
아카시아꽃을 떨어뜨리고 불어온 바람이 깃털속에 박히고 박하꽃 피운 바람이
부리 끝에 와 머무는 밤에도 그들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깨어나 또다른 날빛을
맞으며 가을로 간다
여름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들녘 끝에 개비름꽃 한 점 피웠다 지우듯이
가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산기슭 싸리나무 끝에 굴뚝새들의 단음의 노래를
리본처럼 달아둔다
인간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인간 다음에 이 지상에
남을 것들을 위하여 굴뚝새들은 오리나무 뿌리 뻗는 황토기슭에 그들의 꿈과
노래를 보석처럼 묻어 둔다
그리운 마음 김종원 성악가
작은 이름 하나라도 / 이기철
낭송 도현숙 회원
이 세상 작은 이름 하나라도
마음 끝에 닿으면 등불이 된다
아플만큼 아파 본 사람만이
망각과 폐허도 가꿀 줄 안다
내 한 때 너무 멀어서 못 만난 허무
너무 낯설어 가까이 못 간 이념도
이제는 푸성귀 잎에 내리는 이슬처럼
불빛에 씻어 손바닥 위에 얹는다
세상은 적이 아니라고
고통도 쓰다듬으면 보석이 된다고
나는 얼마나 오래 악보 없는 노래로 불러왔던가
이 세상 가장 여린 것, 가장 작은 것
이름만 불러도 눈물겨운 것
그들이 내 친구라고
나는 얼마나 오래 여린 말로 노래했던가
내 걸어갈 동안은 세상은 나의 벗
내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모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들
그들 위해 나는 오늘도 한 술 밥, 한 쌍 수저
식탁 위에 올린다
잊혀지면 안식이 되고
마음 끝에 닿으면 등불이 되는
이 세상 작은 이름 하나를 위해
내 쌀 씻어 놀 같은 저녁밥 지으며
나는 생이라는 말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시 이기철 낭송 서교현 회원
내 몸은 낡은 의자처럼 주저 앉아 기다렸다
병은 연인처럼 와서 적처럼 깃든다
그리움에 발 담그면 병이 된다는 것을
일찍 안 사람은 현명하다
나, 아직도 사람 그리운 병 낫지 않아
낯선 골목 헤멜 때
등신아 등신아 어깨 때리는 바람 소리 귓가에 들린다
별 돋아도 가슴 뛰지 않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꽃잎 지고나서 옷깃에 매달아 둘 이름 하나 있다면
아픈 날들 지나 아프지 않은 날로가자
없던 풀들이 새로 돋고
안보이던 꽃들이 세상을 채운다
아, 나는 생이라는 말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삶보다 훨씬 푸르고 생생한 생
그러나 지상의 모든것은 한번은 생을 떠난다
저 지붕들, 얼마나 하늘로 올라가고 싶었을까
이 흙먼지 밟고 짐승들, 병아리들 다 떠날 때까지
병을 사랑하자, 병이 생이다
그 병조차 떠나고 나면, 우리
무엇으로 밥 먹고 무엇으로 그리워할 수 있느냐
당신의 한 해는 아름다웠습니다
詩 / 이채 낭송 박영선 회장
바람 불고 비 내려도
나보다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가족처럼 벗과 이웃을 아끼며 사랑하며
사계절 푸른 소나무처럼 살아온
당신의 한 해는 산처럼 숲처럼 고요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아니더라도
릴케의 서정은 아니더라도
생각의 우물이 깊고
마음의 꽃잎이 향기로운
당신은 참 맑고 고운 백합을 닮았지요
늘 부족함 속에서도
튼튼한 사랑의 나무를 키우며
슬기의 잎으로 비바람을 뉘고
인내의 거름으로 믿음의 뿌리를 지켜온
당신은 정직한 한 그루 지혜의 나무였지요
빛과 어둠의 경계를 넘어
지도에도 없는 인생이라는 길을
나침판도 없이 걸어야 했을 때
당신이라고 캄캄한 절벽이 없었겠습니까
당신이라고 고독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샛별 같은 꿈을 안고
다시 일어나는 의지의 당신이여!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하루의 시간 안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던
당신의 한 해는 꽃처럼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닫는 시 이정화 부회장
내가 바라는 세상
이기철 낭송 이정화 부회장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가에 꽃모종을 심는 일입니다
한 번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들이 길 가에 피어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제 마음대로 이름지어 부르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이 혼자 눈시울 붉히면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그 꽃에 다가가
시처럼 따뜻한 이름을 그 꽃에 달아주는 일입니다
부리가 하얀 새가 와서 시의 이름을 단 꽃을 물고 하늘을 날아가면
그 새가 가는 쪽의 마을을 오래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도 꽃처럼 예쁜 이름을 처음으로 달게 되겠지요
그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이미 꽃이 된 사람의 마음을 시로 읽은 일입니다
마을마다 살구꽃 같은 등불 오르고
식구들이 저녁상 가에 모여앉아 꽃물든 손으로 수저를 들 때
식구들의 이마에 환한 꽃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둠이 목화송이처럼 내려와 꽃들이 잎을 포개면
그날 밤 갓 시집 온 신부는 꽃처럼 아름다운 첫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베겟모를 베고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
함께 하는 시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시 이기철
잎 넓은 저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
초승달을 데리고 온 밤이 우체부처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채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놓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 같은 약속도 한다
이슬 속으로 어둠이 걸어 들어갈 때
하루는 또 한번의 작별이 된다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며 완성하는 이별
그런 이별은 숭고하다
사람들의 이별도 저러할 때
하루는 들판처럼 부유하고
한 해는 강물처럼 넉넉하다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도 모두 아름다웠다
나는 낙화만큼 희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건너가고 싶다
떨어져서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 아는 사람에게
상추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낭송시 영상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태주 시인의 시 낭송 영상 (0) | 2020.08.06 |
|---|---|
| 제1회 도동 측백수림 시화전 (0) | 2019.09.07 |
| [스크랩] 제28회 대구음악제-창작합창제 <도성암 가는 길> (0) | 2018.01.24 |
| [스크랩] 김 욱 진 작: 생전 듣도 보도 못한 / 낭송가 이 지 희 (0) | 2017.11.29 |
| [스크랩] 비슬산 참꽃, 시로 꽃피다 (0) | 2017.04.30 |